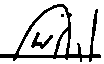- Classic Style
- Zine Style
- Gallery Style
- Community Style
- Studio Style
- Blog Style


나의 큰오빠, 나의 외사촌, 지난 79년에서 81년까지 영등포여고 산업체특별학급에 다녔던 그녀들, 최홍이 선생님, 그리고 나, 여기 머무는 동안, 내게 과거가 될 수 없는 희재언니에게외딴방 - 신경숙
외딴방은 상,하권으로 되어있었는데 내가 다시 구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저자는 한권으로 통합하자는 출판사의 꼬임에 넘어간 뒤였다. 소설의 처음에 써놓고 끝부분에 다시한번 이 소설이 사실과 픽션의 중간쯤이라 밝혀 놓은 것을 보면, 저자 내적으로 설득력에 대한 갈등과 소설의 사실 유무의 잣대 앞에서 어떻게 써내야 하는지가 최선인지에 대해 짓누린 고통과 시달림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볼만 하다. 이야기는 시골에서 쇠고랑에 발을 찧고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무료한 소녀가 도시의 공장에 취직해 눈치속에 산업체 야간학교를 다니는데서 시작한다.
삶은 아름다운 것, 이라고만 했다. 아름다워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아름다워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앗아갈 것인지에 대해 그는 말하지 않았다. ..... 음식을 만들 때만 아버지는 남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를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끊임없이 어떤 순간들을 언어로 채집해서 한 장의 사진처럼 가둬놓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문학으로선 도저히 가까이 가볼 수 없는 삶이 언어 바깥에서 흐르고 있음을 절망스럽게 느끼곤 한다. .... 정리할수록 그 단정함 속에 진실은 감춰진다.
어떤 미래 속에서도 그를 잊지 않으리. ..... 눈이 잘 녹지 않던 그 골목. 세상은 많은 골목들을 숨기고 있다. ..... 큰오빠의 여자는 오빠를 떠나기 위해 그 골목에 또각또각 발짝을 남겼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그 골목에 발짝을 남겼다.
파스 냄새 때문에 눈물이 글썽해진다.
파스 냄새는 정말 눈물나게 한다.
헤겔을 읽는 미서처럼,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남긴 찬란한 문구들을 부기 노트 귀퉁이에 옮겨놓고 있는 그때에만, 그 교실의 그 얼굴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되었던 건 아니었을까.
진짜 바다를 보고 '빠-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 손가락 끝을 보며 '빠-ㄷ'라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헤어질 때 그애는 나를 향해 제 손가락을 쭉 뻗으며 '빠---다'라고 소리쳤다.
밀물의 어느 순간과 썰물의 어느 순간은 일란성 쌍둥이같이 똑같다. ..... 그와 그녀는, 밀물과 썰물은, 희망과 절망은······ 삶과 죽음은 같은 말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