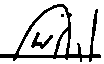- Classic Style
- Zine Style
- Gallery Style
- Community Style
- Studio Style
- Blog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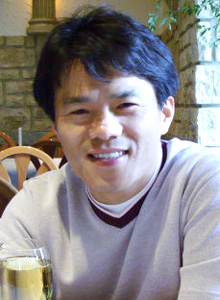
모든 문명사회는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도움을 자연스런 미덕으로 간주한다. 고통에 깃든 불행을 직시하는 연민은 분명 아름다운 도덕이다. 그러나 고통 받는 타인과의 진정한 연대를 거부하는 연민은 오히려 비도덕적일 수 있다. 연민이 고통 받는 타인에 대한 도움과 시혜를 선전한다면, 연대는 타인의 권리 찾기를 강조한다. 연민은 고통과 행복의 분리에서 생기지만, 연대는 행복에서 고통을, 고통에서 행복을 보기 때문이다. ‘더 많은, 더 높은, 더 화려한 성공’을 약속하는 현대 문명은 이처럼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연민의 도덕에서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얼마 전 성공한 친구의 자녀교육론을 들었다. 그 친구는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의 현장을 체험학습의 소재로 선택한단다. 그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호화주택과 빈민가 중에서 어느 곳에 살고 싶은지, 고급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삶과 온종일 세차장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삶 중에서 어느 쪽을 자신의 미래로 선택할지.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대비시킨 이 섬뜩한 교육관을 누가 비난할 수 있으랴. 어둠을 경멸하고 빛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본질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교육인데.
그날 새벽 네온사인이 흉측해져 가는 시간, 집 앞에서 폐지를 모으는 꼬부랑 할머니를 보았다. 친구의 말에 반론이라도 제기하듯 할머니에 대한 연민이 밀려온다. 친구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아이들은 앞으로 할머니의 삶에서 느껴지는 버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고통과 상처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때마다 그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뒤처지지 말자, 성공하자’고 자신을 다그칠까 두렵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아이들과 고통에 직면한 타인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통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연민도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않고, 빛 속의 어둠을 보지 않으려는 현대인의 자기기만이 아닐까.
고통의 뿌리에 다가서지 않는 감상적 연민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빛과 어둠의 이분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연민은 타인의 고통과 상처를 그의 운명이나 무능함으로 환원시키려는 내면의 음모로 쉽게 변질된다. 연민은 고통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체념을 은연중에 부추긴다. 더구나 연민은 타인이 겪는 고통의 뿌리와 자기 삶의 안락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연민이 위선적인 경우는 고통 받는 타인의 삶 속에 깃든 아름다운 빛을 보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지나치게 과장할 때다. 가난, 질병, 장애보다 그것을 불행이나 비정상으로 보는 시선이 고통과 상처를 더 키운다.
타인의 고통은 그의 운명이나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다. 나의 행복은 언제나 타인의 고통에 빚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통 받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시혜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나와 너의 연대가 필요하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슬픔에서 멈추지만, 연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한다. 연민을 넘어 연대를 지향하는 사람만이 가난과 상처, 고통에서도 아름다운 진실을 볼 수 있다. 만남, 소통, 연대의 장에서 어둠 속에 깃든 빛을 보는 사람들만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빛(풍요)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어둠(빈곤)을 폭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성공 이데올로기 교육은 연민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의 아이들은 연대는커녕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로 길들여지고 있다.
/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 한겨레 (http://www.hani.co.kr) 2006-05-24